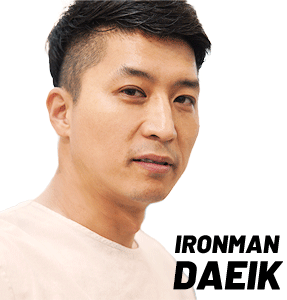책은 저자가 쓰고 독자가 읽는다. 독자는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저자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교과서든 소설이든, 혹은 철학서든 만화책이든 다 마찬가지다. 책을 통해 저자와 독자는 대화를 나눈다. 저자가 말하는 내용(감동이든 정보든)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독자는 그 책을 잘 읽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상식적인 책읽기다.
실은 책만이 아니라 매체라면 전부 다 그와 같은 메시지의 ‘유통 구조’를 따른다. 메시지도 일반 상품처럼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다. 생산자의 의도를 읽는 게 소비자의 의무다. 책의 저자와 마찬가지로 화가와 음악가도 그림과 음악을 통해 뭔가 메시지를 나타내며, 감상자는 그 작품을 보고 들으면서 예술가의 메시지를 포착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문화의 생산과 소비 과정이다. 그런데 따져보면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과정은 사실 그리 단순하지 않다.
저자는 어떤 주제에 관해서 글을 쓰고 독자는 저자가 설정한 주제를 생각하면서 책을 읽는다고 가정할 때, 독서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책의 논리(저자의 관점) 속에 뛰어들어 그것에 따라 책을 읽을 것인가, 아니면 독자가 자신의 논리(독자의 관점)에 따라 그 책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소화할 것인가? 앞의 것이 학습이라면 뒤의 것은 비평이다. 학습이 올바른 독서일까, 비평이 올바른 독서일까?
이것은 흔히 접하는 독해의 딜레마이지만 해석학의 고전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마침 얼마 전에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본의 아니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 국가적 경사로 국내에서 한의학계에게 주도권을 빼앗길까 두려워한 대한의사협회는 그 가치를 애써 축소하려 했다. “동의보감은 말 그대로 세계의 기록 유물이지 첨단의학서가 아니다.”
불순한 의도를 제거하고 보면 의사들이 주창하는 논지는 사실 그르지 않다. 동의보감이 아무리 의학과 약학을 집대성한 문헌이라 해도 편찬된 지 400년이나 지난 의학서다. 그렇다면 오늘날 동의보감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의사들이 말하듯이 첨단의학서보다는 문화유산으로 대하는 것일 게다. 하지만 그렇다면 박물관에나 처박혀 있어야 할 동의보감을 왜 오늘날 한의사들이 여전히 중요한 참고서이자 전거로 활용할까? 그 이유는 동의보감이 바로 ‘고전’의 가치를 가지는 문헌이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의 모든 고전은 이중적 독해가 가능하다. 공자의 <논어>와 플라톤의 <정치학>은 인구 수만 명에 불과한 고대 도시 사회를 배경으로 쓴 책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고전이라 해도 거기 나오는 처방에 따라 현대 정치를 운용한다면 비웃음만 살 뿐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문헌들은 시대를 초월하는 고전의 정신과 향기를 품고 있으므로 어느 시대에나 독자에게 깊은 감동과 근본적인 교훈을 줄 수 있다. 고전의 참된 의미는 바로 그 이중적 독해가 가능하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은 자본주의 경제를 탁월하게 분석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경제서’로 봐야 할까? 아니면 자본주의 초창기인 19세기에 그 시대의 문제의식을 정확히 담아냈던 책이지만 이제는 하나의 ‘역사서’, 혹은 ‘고전’이 되었다고 봐야 할까? 경제서라면 <자본론>의 경제학적 ‘이론’을 이어받아야 할 것이고, 역사서라면 <자본론>의 역사적, 해방적 ‘이념’을 이어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중적 가치를 가졌다는 점에서 <자본론>은 경제학의 이론과 역사적 이념이 잘 조합된 훌륭한 고전이 된다.
이렇듯 독해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독일의 해석학자인 가다머는 문학을 해석할 때와 비문학을 해석할 때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문학의 해석은 기존의 독해법처럼 저자와 독자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문학의 경우는 다르다. 문학에도 물론 저자의 메시지가 있지만 문학 작품의 독해는 반드시 저자의 의도를 읽어낼 필요가 없다. 저자가 구성한 스토리와 캐릭터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고, 독자가 그것들을 나름대로 해석해도 상관없다.
문학의 독해에서는 저자가 뒤로 물러앉고 언어 자체가 전면에 등장한다. 저자의 역할은 해석의 원초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그 대신 독자의 지평이 끝없이 넓어진다. 이 무한한 해석의 지평은 끝없는 독해를 낳는다. 궁극적으로 보면 작품은 사라지고 독해만 남게 된다. 그래서 문학은 저자의 의도와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며, 심지어 저자조차 한 명의 해석자로서 역할할 뿐이다.
그런데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인 데리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그런 구분조차 무시한다. 가다머는 전통적인 입장에서 진일보했으나 책 속에 저자의 의도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 그러나 데리다가 보기에 책에는 저자의 의도 같은 게 없다. 책은 저자와 독자가 다정하게 대화하는 의사소통의 통로가 아니다. 책은 저자가 자신의 의도를 완벽하게 담아내는 매체도 아니고, 독자가 수동적으로 저자의 의도를 읽어내는 매체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리다는 전통적인 독해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한다.
책을 해석할 때 늘 필수적인 두 축으로 여겨졌던 저자와 독자가 해체된다. 물론 이 말은 저자와 독자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양측의 연관이 생각하던 것만큼 당연하지 않다는 의미다. 저자는 책을 쓸 당시에 특정한 독자를 미리 연상할 수 없으며, 독자는 저자의 의도야 어떻든 그 책을 자기 마음대로 읽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저자와 독자는 전통적인 독해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서로 투명하게 친한 사이가 아니며, 오히려 서로에 대해 전혀 모르는 낯선 관계다. 저자도 독자도 확정된 실체가 아닌데, 어떻게 저자에게서 독자에게로 의미가 순조롭게 흐를 것을 기대하겠는가?
저자와 독자가 해체되면 책의 내용도 해체된다. 한 권의 책을 관통하는 일관된 내용, 진리, 전체 같은 것은 애초부터 없다. 책은 독자에게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거나 특정한 감동을 주지 않는다. 독자는 단지 손에 들고 있는 책을 읽음으로써 직접 뭔가를 생산할 수 있을 뿐이다. 바둑 한 판을 두면서 대국자들은 수많은 판을 머릿속에서 두듯이,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 같은 필름들을 가지고 수많은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듯이, 한 권의 책은 독자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책들을 생산하고 재생산한다.
데리다가 독해 과정을 해체한 이유는 지배적인 독해가 행사하는 억압적 권력을 해체하려는 데 있었다. “왕이 공사를 시작하면 일꾼들에게 할 일이 생긴다.” 독일의 시인 실러가 한 말인데, 칸트 같은 대철학자가 등장하면 수많은 주석자들이 칸트 철학을 가지고 먹고산다는 이야기다. 한 훌륭한 고전이 권위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권위가 주석자들에 의해 화석화되어 다른 모든 해석들을 질식시킨다면 그 고전의 원래 저자도 바라지 않는 현상일 것이다.(서양 중세에 교회가 성서 해석을 독점한 것이 얼마나 큰 역사적 폐단을 낳았던가?)
지배적 독해의 가장 해악적인 측면은 바로 다양한 관점을 용인하지 않는 데 있다. 억압적 권력은 단일한 독해만을 제시하면서 그에 따르는 것만이 사회적 합의와 단결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그런 강요된 합의는 자주 파시즘으로 향한다는 것을 역사는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
남경태
인문학 저술가 및 번역가 dimeola@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