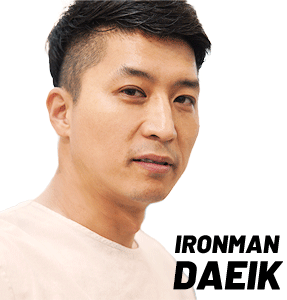아래 내용은 대학내일 2010 11월호 35페이지에 실린 인터뷰 내용인데 매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주는 것이어서 발췌해 봅니다.
잡지가 상위저널이라는 근거가 뭔가?
일간지 기자는 객관적이려고 한다. 사실 객관적이지도 못하면서, 잡지는 대놓고 주관적이다. 에스콰이어 모토는 ‘편견’과 ‘독단’이다. 그 편견과 독단이 독자의 수긍 얻으려면 물론 사유의 깊이가 있어야 한다. 이건 에디터의 조건과도 일치하는 건데, 에디터는 삐딱해야 한다. 항상 물음표를 갖고 의심해야 한다. 잡지기사는 시비를 걸면서 쓰는 거다. 그래서 독자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면서 지평을 넓혀줘야 한다. 신문은 편을 가른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 적개심을 갖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 신문은 감정적이다. 잡지는 오히려 이성적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라는 식으로 기사를 쓴다. 광고만 봐도 답이 나온다. TV 광고에는 주로 생필품, 보험, 카드, 화장품, 과자광고 나온다. 케이블 TV에는 대출과 보험광고가 주다. 서민이 타겟이다. 신문은 주로 재테크 광고한다. TV보단 돈 있는 사람,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주목표로 한다. 에스콰이어는 명품 광고한다. 가진 사람 위한 거다.
———————–
결국 독자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지 못하는 잡지는 존재 가치가 없는 찌라시에 불과하고, 그런 매채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위 인터뷰에서 배울 수 있었다.
——————
에스콰이어는 다른 잡지와 어떻게 차별화되나?
에스콰이어도 인문학 부활 꿈꾼다. 패션을 다루더라도 사회학적으로 설명한다. 매스미디어에서는 어떤 패션 아이템이 유행하기 시작하면 단순히 누가 입어서 따라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데, 천박한 사고방식이다. 한국의 미니스커트 시작은 운복희라고 하는데, 윤복희는 1960년대 말에 그렇게 입고 온 적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가 없었으면 그 시대에 미니스커트가 유행하지 않았을까? 패션의 유행은 대중의 묵시적 합의로 이루어지는 거다. 패션은 그 시대의 반영이고,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자기 사는 시대를 반영하는 거다. 거기에는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국제적 이해관계가 모두 맞물린다. 그걸 설명해준다. 우리 잡지는
에디터들은 혹독한 수련을 하겠다.
회의 때 딴지 많이 건다. 기자들이 기획안을 내면 얘가 얼마나 고민하고 논리적으로 구상했는가를 알아보려고 계속 찌른다. 예를들어 ‘스칼레톤 문양이 유행이라 그 프린트 티셔츠를 소개하고 싶다’는 기획안이 올라오면 계속 질문한다. 그러면 “이라크 전쟁 대문에 사람들이 신물을 느껴서 스칼레톤 문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이 나한테 들려야 한다. 이런 인문학적 소양이 중요한 이유는, 에디터는 어떤 트렌드가 등장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이것이 과연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 읽어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