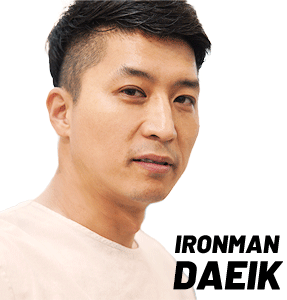숫자는 자동차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그래도 이미지는 못 이긴다.
기사와 블로그를 검색하고 전문지 기사를 살펴본다. 전문가의 조언도 구한다. 새차와 중고차 사이의 갈등, 1천 8백만원짜리 소형차와 2천 1백만원짜리 중형차 사이의 고민, 배기량, 마력, 토크, 공인연비, 시속 100킬로미터까지의 가속 시간…, 관심 없던 성느제원에도 신경이 쓰인다. 단 몇 마력이라도 처지는 차를 사고 싶진 않다. 공인연비도 챙기고 싶다. 그럼 디젤 엔진을 살까? 소음이 신경 쓰인다. 하이브리드? 좀 답답할 것 같다. 갈팡질팡이다. 새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요동친다. 고민은 돌고 돌아 결국 가격과 브랜드, 디자인으로 수렴할 거라는 걸 다 알면서도,
가격은 돈, 브랜드와 디자인은 이미지다. 성능제원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결정적이지 않다. <탑기어> 한국판 김우성 편집주간은 이렇게 말했다. “토크, 마력, 최고속도 같은 제원들은 기계적으로 중요합니다. 기자가 자동차를 평가하는 척도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로 차를 구매하는 사람, 심지어 자동차 전문 기자에게도 그것은 허수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대다수의 통녑에 자리 잡은 그 차의 이미지, 둘째는 용도, 셋째가 디자인과 가격이죠. 고민은 많이 하고, ‘그 차는 잘 안 나가’ 투덜대기도 해요. 그렇다 해도 그 모든 사람이 엄청나게 잘나가는 차들을 사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미지야말로 자동차 문화의 시작이었따. 그 이미지는 계급과 경제력에 닿아있었다. 1886년, “말 없이 달리는 마차를 만들겠다” 선언하고 최초의 자동차를 만든 건 칼 벤츠였다. 그걸 최초로 상용화한 나라는 프랑스였다. 그 떄의 자동차는 귀족과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다. 각기 다른 차를 가진 귀족들이 그들의 마당에 모여 서로의 차를 감상하고 평하던 것이 모터쇼의 기원이다. 1908년,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식 조립 라인으로 ‘최초의 대량생산 자동차’ 모델 T를 만들기 시작했따. 2,900CC 4기통 엔진을 쓰고, 시속 60킬로미터로 달렷다. 포드는 당시 2천 달러 이상이었던 자동차 가격을 8백 50달러로 묶었다. 이상이 현실이 됐고, 중산층도 자동차를 살 수 있었다. 귀족이 된 것 같은 환상도 어느 정도는 충족됐다. 포드는 이렇게 말했다. ” 자동차를 사기위해 부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사야 한다.” 자동차에는, 태생부터 계층을 결정하는 속성이 있었다.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강준만 교수가 쓴 <자동차와 민주주의>에 이런 구절이 있다. “과연 도로는 자유의 상징이었던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엔 엄격한 계급 구분이 존재했다. 1950년대 후반 대기업들은 사원들의 직급에 따른 6단계의 차량 운용 지침을 갖고 있었다.” 지침에 따르면, 세일즈맨은 2천 2백 달러 정도의 포드, 쉐보레, 플리머스를 살 수 있었다. 세일즈 수퍼바이저는 2천 5백 달러선, 부 세일즈 매니저는 2천 8백 달러 선의 머큐리, 폰티악, 닷지, 부장급은 천 1백 달러 선의 크라이슬러, 링컨, 캐딜락을 탔다. 부사장급 이상은 돼야 어떤 종류의 캐딜라깅나 살 수 있었다.
유럽의 자동차 문화가 모텃포츠를 기반으로 발전했다면, 미국은 대중문화와 함께였따. 잭 프로스트라는 가수는 ‘You can’t afford to marry me if you can’t afford a ford(포드 없이는 나와 결혼할 수 없어요)’라는 노래를, 벤 블랙과 아트 힉맨이라는 가수는 “Take me on a buick honeymoon(뷰익을 타고 신혼여행을 가요)”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대리점에서 몇 대의 캐딜락을 한꺼번에 사면서 지나가던 아주머니에게 한 대 선물하기도 했다. 영화 <위대한 캐츠비>에 노란색 롤스로이스가 등장하는 것은 치밀한 계산이다. 자동차는 성공의 상징이자 과시욕의 핵심이었다. 김우성 주간은 이렇게 말했다. “토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차가 미국을 점령한 시기가 있었죠. GM도 위기가 있었고요. 하지만 캐딜락은 영원한 성공과 낭만의 상징이죠. 지금도 강력해요. 이런 게 이미지의 힘입니다.
2012년의 자동차 시장, 이미지의 힘은 더 강려해졌다. 브랜드 이미지가 구매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브랜드 이미지는 허수가 아니다. 실체가 있다. 판매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오토타임즈> 박진우 기자는 이렇게 지적했다. “지금 자동차 시장은 사실 부품 공급사와 이미지 싸움이에요. ZF라는 변속기 회사가 있었요. 그 변속기를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이 다 쓰죠. 다른 부품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실질적인 품질 차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자동차를 기계적 특성으로 차별화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지금 자동차 회사는 철저히 세계 시장에서 경쟁한다. 각 브랜드가 국적에 따른 특성들을 유지하고 있다 해도, 점점 희미해지는 게 사실이다. 독일차는 서스펜션이 딱딱하고, 미국차는 거대하고 편안하며, 일본차는 실용적이라는 식의 구분에 별 의미가 없다. 독일 자동차 회사도 중국과 인도 시장을 겨냥한 차를 만든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동시 겨냐한다. 북경에서 발행하는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기관지 <중국 청년보>는 시장조사업체 AC닐슨의 내용을 인용해 “중국의 주민소득 즈앧와 과시욕으로 중국 고급차 시장이 5년안에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 보도했다. AC닐슨은 “5년안에 1백만대 규모의 중국 고급차 시장이 2백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봤다. 폭스바겐은 앞으로 4년 동안 1백 40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했따. GM은 10억 6천만달러(약 1조 1천백억원)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세운다. 현재 자동차는 중국 현지ㅔ서 연간 1백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자동차 시작의 규모가 중국, 인도 같은 신흥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인수, 합병도 진행됐다.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은 벤틀리 부가티, 람보르기니, 포르쉐, 스코다, 세아트 등의 브랜드를 갖고 있다. 그 안에서는 플랫폼 공유가 활발하다. 포르쉐카이엔은 폭스바겐 투아렉, 아우디 Q7과 같은 플랫폼을 쓴다. 폭스바겐 골프와 아우디 A3도 같은 플랫폼이다. 박진우 기자가 말했다. “한국에서 폭스바겐 투아렉이 부진했던 이유도 사실은 거기 있어요. 비슷한 가격이면 폭스바겐보다 포르쉐를 갖고 싶었던 고객이 많았죠. 투아렉은 훌륭한 SUV였지만.” 재규어와 랜드로버의 지분은 인도 타타모터스가 갖고 있다. 하지만 영국자 ㅊ재규어에서 인도 모기업의 이미지를 찾는 건 쉽지 않다. 재규어와 랜드로버는 여전히 고급하며, 영국 귀족의 자동차라른ㄴ 이미지를 고수하고 있다.한편 볼보는 중국 지리 자동차에 인수된 후 갈피를 못 잡고 있따. 북유럽, 스웨덴이라는 국적과 볼보의 특성은 상호보완적인 요소가 있었따. 북유럽 날씨, 복지 상호아과 맞물려 사람을 보호하는 튼튼한 자동차라는 상승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중국 이미지’에 발목이 잡혔다. ” 지리 자동차는 재정적인 축면을 담당하고 있어요. 기술과 디자인은 볼보 고유의 것을 지키고 있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2011년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만난 볼보 본사 마케팅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지만….” 볼조 이제 중국차 아니야?” 사정을 모르는 대중은 이렇게 말하낟. 계약은 그들이 한다.
지금 한국 자동차 시장의 이미지는 수입차와 국산차로 양분돼 있다. BMW 미니나 지프처럼 독보적인 이미지를 구축한 몇몇 브랜드를 제외하면, 수입차는 재력과 성공이라는 임지ㅣ를 공유한다. 선망의 대상이라는 것 자체에 매력이 있는 셈이다. 국산차의 이미지는 혼란스럽다. 90년대에 현대 소나타를 사면 비로소 중산층이 된 것 같았따. 그랜저는 ‘성공한 아빠’이 상징이었따. 뿌듯한 소비였다. 국산 자동차가 꿈이자 낭만이었던 마지막 시기였을 것이다. 이후의 국산차 회사는 문화를 만들기 전에 덩치를 불렸다. 품질은 일취월장했지만 ‘드림카’를 만들진 못했다. 김우성 주간은 이렇게 아쉬워했다. “폭스바겐 골프는 객관적으로 훌륭한 차지만 놀라운 차는 아니거든요. 하짐나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갖고 싶어해요. 골프에는 골프의 유산과 이미지가 있으니까. 현대 i30을 세세히 살펴보면 골프에 뒤질 게 없는 차예요. 디자인도 훌륭하죠. 하지만 ‘내가 언젠가는 꼭 i30을 사야지’ 그러는 사람 없어요. 필요하면 돈에 맞춰 사는 거죠. 덩치를 불리는 동안 이미지와 스토리를 놓친 거에요.”
‘잘 만든 차’와 ‘꼭 갖고 싶은 차’는 겨울과 여름처럼 다른 얘기다. 전자는 기계적 특성이고, 후자는 이미지다. 지금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자동차는 대략 2백여 종에 달한다. 특장이 있는 몇몇 브랜드를 제외하면 기술과 부품은 평준화되고 있다. 잘 만든 차를 샀다고 그 살벌한 성능을 100퍼센트 만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필요의 영역을 벗어난 수치, 일상의 영역을 벗어난 기능, 몸으로는 차이를 느기기 어려운 기술… 자동차는 가장 첨단의, 치열하고 사실적인 기계다. 그게 자동차의 본질일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만큼 충실하게 환상에 의지하고 이미지에 봉사하는 소비재도 드물다. 이 또한 자동차의 속성이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 마음을 지배하는 건 숫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