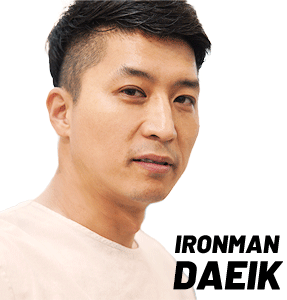6개월 정도 스포츠 업계에 몸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나이키나 뉴발란스, 그리고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들의 마케팅 담당자들과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일은 회사일이고 박병훈 선수같은 국제적인 선수를 연결해주기 위해 그쪽 담당자들에게 작업(?)을 계속 넣고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고 있다하더라도 쉽지 않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트라이애슬론이 대중적이지 않아서 그런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우선은 선수 자신의 상품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쪽 담당자들은 트라이애슬론에 대해 자세히 알고있지도 않고 설사 알고 있다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들여 어플라이 하는 선수에 대해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선수들은 자신의 경력과 프로필등을 문서화 시켜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제 이런 작업은 전문 스포츠 메니지먼트 회사들이 해줍니다. 선수의 브랜딩 작업인데 그 선수를 이미지화 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대회 성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 선수의 상품적 가치가 어느정도 되는지 ‘수치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현실에 이런 메니지먼트 회사를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것 같습니다. 결국 선수 본인이 우선은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창력이 좋은 가수라 하더라도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경우는 매우 힘든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수치화된 서류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브로셔 정도는 제작해두고 꾸준히 업데이트 시키며 기회를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런 브랜드 회사들은 마케팅 비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당장 그들이 선수계약을 맺더라도 매달 현금지원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다음 회계년도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동안 꾸준히 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에는 ‘인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선수가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비용만 지원받고 자신은 운동에만 매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자신의 ‘상품성’을 높여야 됩니다. 꾸준히 자신을 대중(동호인)에게 노출시키고 또 스폰서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예전에 캐나다에서 잠시 머무를때 스폰서를 찾는 캐나다 프로선수를 만나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트라이애슬론 종주국입니다. 그래서 스폰서 구하는 것이 쉬울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국가에서도 ‘상품성’있는 일부 선수를 제외하고는 스폰서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고 합니다. 그 ‘상품성’은 단순하게 순위와 비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순위는 기본이고 그것외에 ‘여러가지’를 요구합니다.
점점 국내에서도 직업선수들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조금이나마 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부족한 글을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