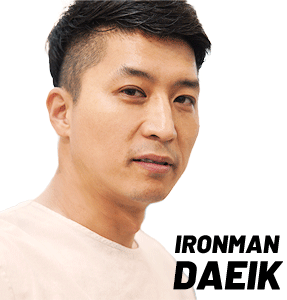올해 한국은 페스티벌 전쟁 중이다. 최근 1년 동안 전국에서 치러진 대형 음악 페스티벌의 수는 무려 서른개에 육박한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음악계 사람들은 이 땅을 ‘페스티벌 저주의 땅’이라 불렀다. 1999년 ‘한국의 우드스탁’을 표방하며 야심차게 개최되었던 ‘인천 트라이포트 락 페스티벌’이 기록적인 집중 호우 때문에 처참하게 무너졌고 5년 후 가평에서 시도했던 국내 최초의 재즈 페스티벌 역시 비 때문에 운명을 달리해야 했다. 2006년이 되어서야 ‘트라이포트 락 페스티벌’이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로 부활하면서 이 땅에도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홍수 수준에 이으렀다.
올해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찾은 나는 양쪽 스테이지를 오가던 중 갑자기 서늘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동안 페스티벌에서 경험하지 못한 이 기분의 정체를 곰곰이 생각해 봤다. 그러고 보니 매년 관객들이 준비해오던 깃발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새마을 깃발도, 눈알 빠진 토끼 인형도 보이지 않았다. MB 정권을 조롱하거나 ‘나 오늘 생일이야 한번만 안아줘.’등으로 낙서된 티셔츠나 환자복, 농부복과 같은 독특한 페스티벌 복장을 준비한 관객들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저 라디오헤드를 비롯한 해외 뮤지선 라인업과 온갖 CJ 계열 브랜드들의 홍보 부스, 그리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들만 눈에 보일 뿐이다. 심지어 CGV의 팝콘과 추러스를 구이 여기서 또 만나야 하다니… 알고보니 쾌적한 공연 관람을 위해 주최 측에서 깃발과 표지판 등을 반입 금지한 것이라고 했다. 이건 페스티벌이 아니라 CJ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영업장일 뿐이었고, 관객들은 페스티벌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아니라 일개 소비자로 전락한 것이었다. 행사 진행 스태프들이 입은 티셔츠에 쓰인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It’s culture’라는 문구를 보고 반문하고 싶었다. 무엇이 문화이고 무엇이 페스티벌이지?
음악 페스티벌은 ‘음악’을 주제로 돈을 만드는 것이 아닌 또 하나의 사회를 만드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세계 최초의 록 페스티벌인 우드스탁의 경우 비즈니스로 접근하면 최악이 아닐 수 없다. 유료 관객들보다 더 많은 수십만 명의 무료 관객이 몰려들어 펜스가 무너졌고 결국 사흘 동안의 무료 공연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었으니 말이다. 식수나 음식, 화장실 등도 턱없이 부족하고 진흙탕으로 가득한 비위생적인 이 축제가 전설적인 페스티벌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젊은이들의 히피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우드스탁 기간만큼은 모두가 하나가 되었고 그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세계 최고의 페스티벌로 인정받는 영국 ‘글라스톤베리’가 뮤지션 라인업을 발표하지 않고도 티켓 오픈 몇분 만에 수십만 장을 매진시키는 힘도 바로 음악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사회로 초대받고 싶은 사람들의 열망 때문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일본 ‘후지 록 페스티벌’ 역시 굳이 뮤지션의 공연을 관람하지 않더라도 사흘 밤낮으로 놀거리가 널려 있다. 또한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직접 분리수거하고 이는 재활용되어 다음 해에 사용할 화장지로 재탄생하기도 한다. 뮤직 페스티벌과 환경 캠페인 역시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 않는가.
물론 초기의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나 지산 록 페스티벌에서는 문화를 만들어보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감행되었다. 각지에서 활동하는 행위 예술가들을 초청했고, 음악 관련 독립 영화들을 소개했으며 홍대앞의 디자인 아티스트들을 불러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장터도 만들어주었다. 심지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문신을 합법적으로 하는 의사를 초대해서 무료 시술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2012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수많은 세프티벌 중 이런 문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다. 유일하게 이런 고민을 수년동안 해온 곳은 ‘쌈지사운드페스티벌’ 뿐이다. 대형 페스티벌과는 반대로 지금껏 단 한번도 유명 해외 뮤지션의 출연이 없어지만 장기하와 얼굴들, 국카스텐, 넬 등과 같은 인디 유망주를 발굴해냈다. 젓가락으로 콩 골라내기 놀이, 광주리 머리에 이고 달리기, 뮤지션들이 키운 농산물 장터,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한 유기농 음식 뷔페와 직접 설거지하는 설거지 공장, 심수봉과 인디밴드의 협연 등 기발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기획을 10년이 넘도록 고수해왔다. 물론 모기업의 부도로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지만 그 기본 골격만은 변함이 없다. 이들의 생명력은 기생적인 해외 뮤지션 라인업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만들어온 자생적인 축제 문화에 있기 때문이다.
해외 뮤지션 라인업으로만 채워진 페스티벌은 자체적인 생명력이 없기에 그 해외 뮤지션 라인이 끊기면 언제라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만약 처음부터 몇몇 해외 뮤지션 라인업으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다른 안전한 비즈니스를 선택하라고 권하고 싶다. 비즈니스로 보면 페스티벌은 그리 매력적인 사업 모델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이미 한국은 기초 체력 없는 ‘페스티벌 비만 국가’이기 때문이다.